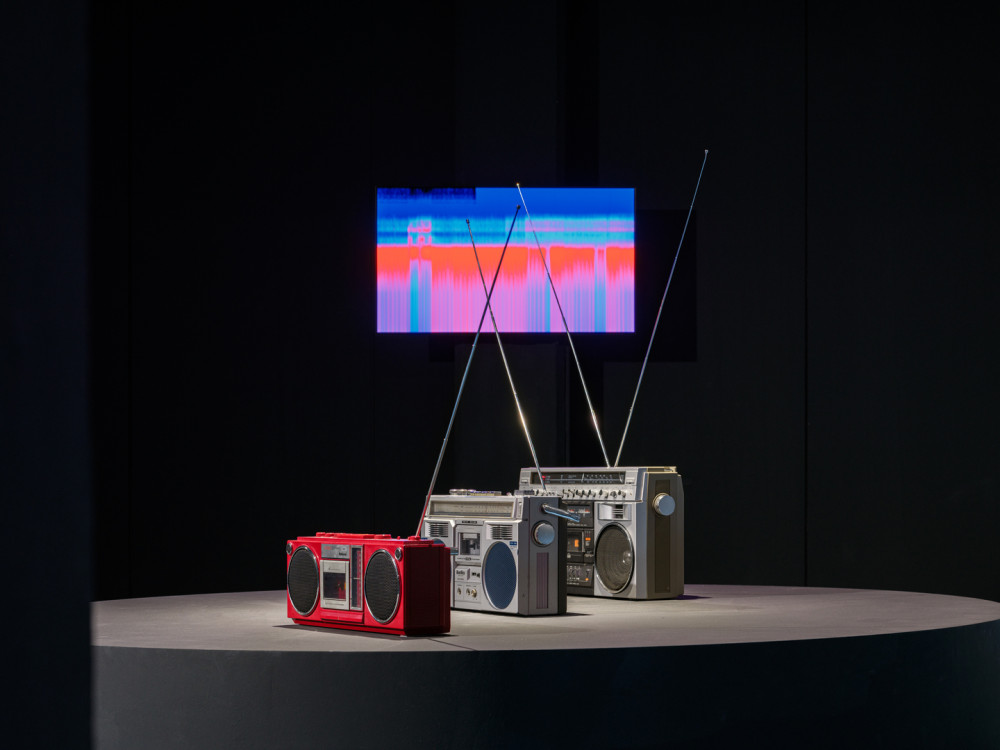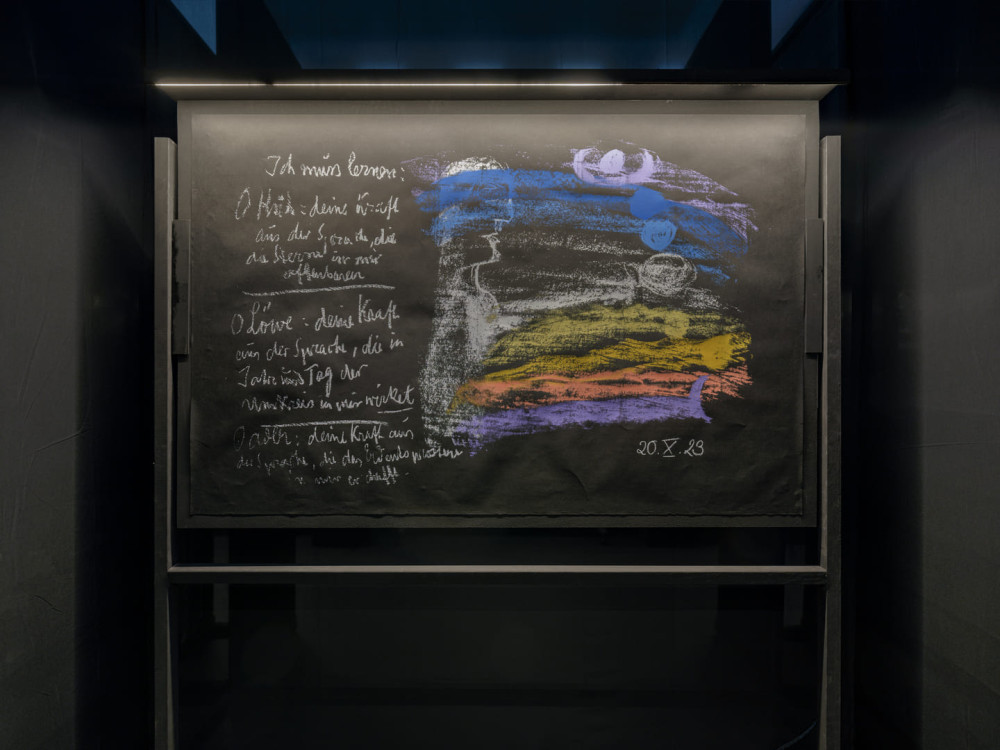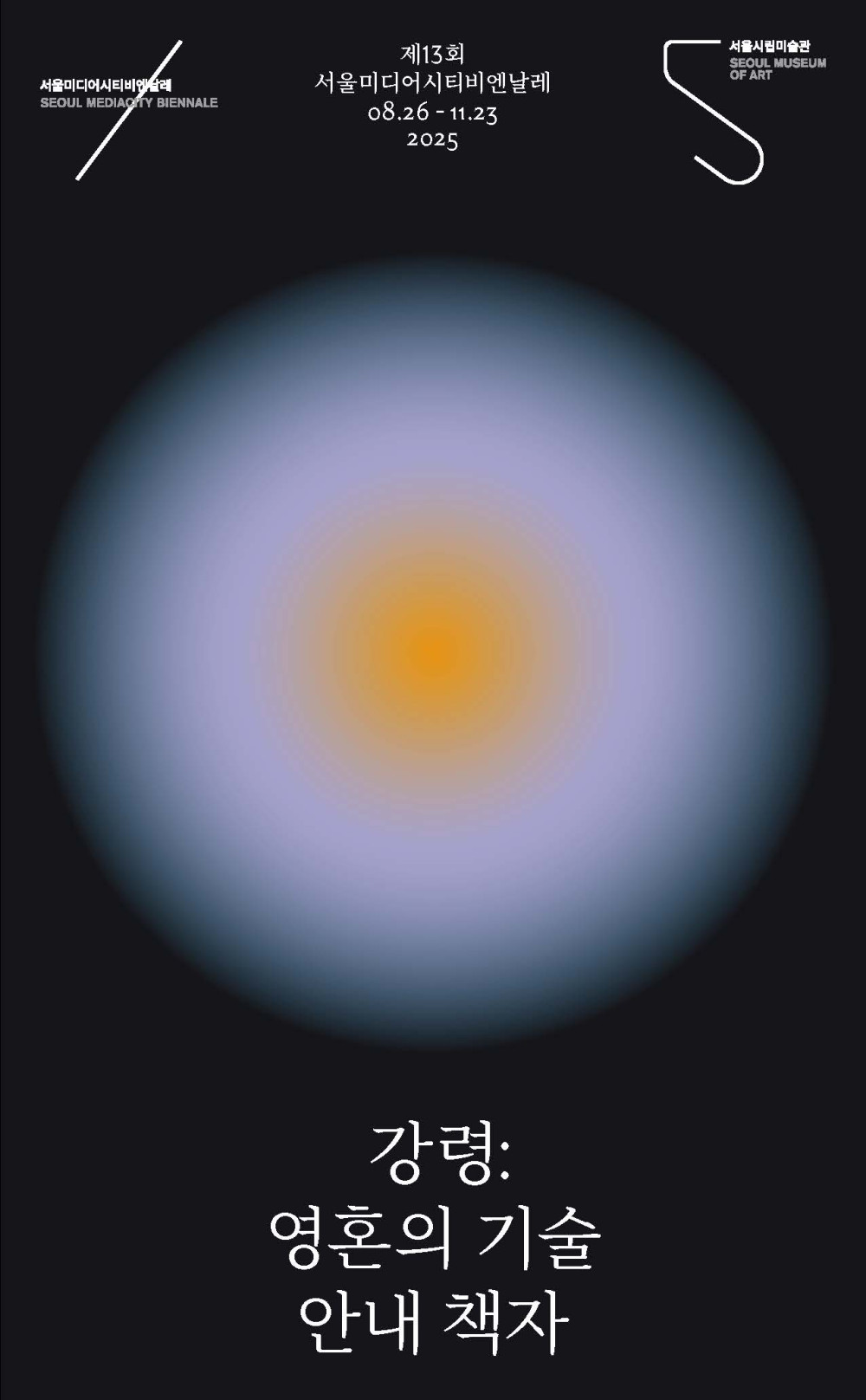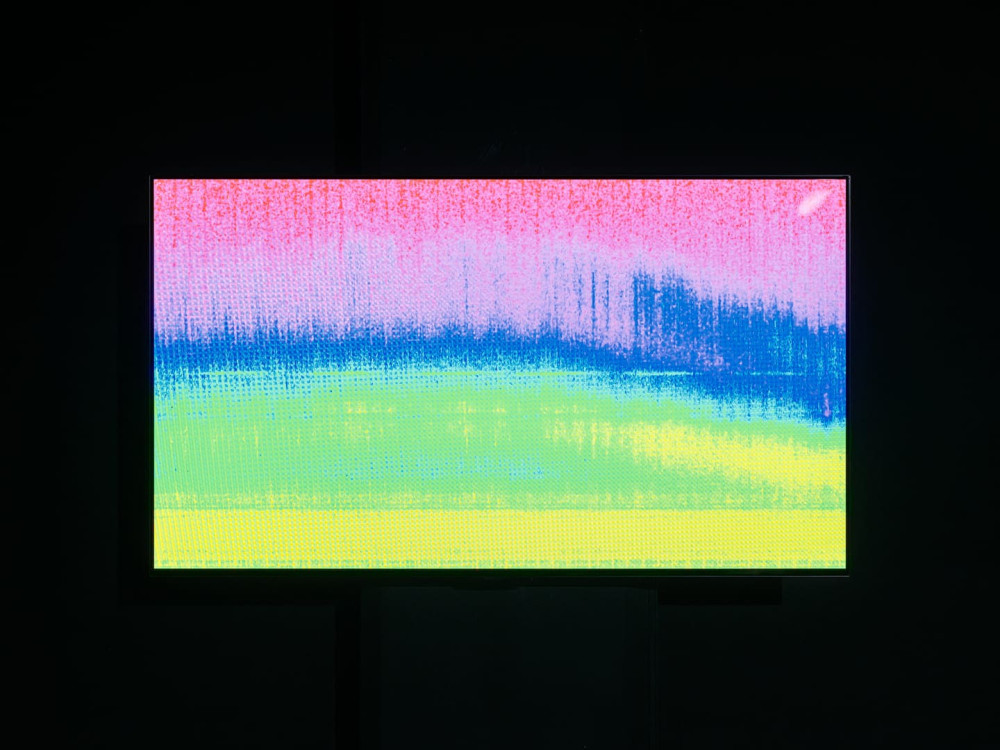천사와 악마
다니엘 무지추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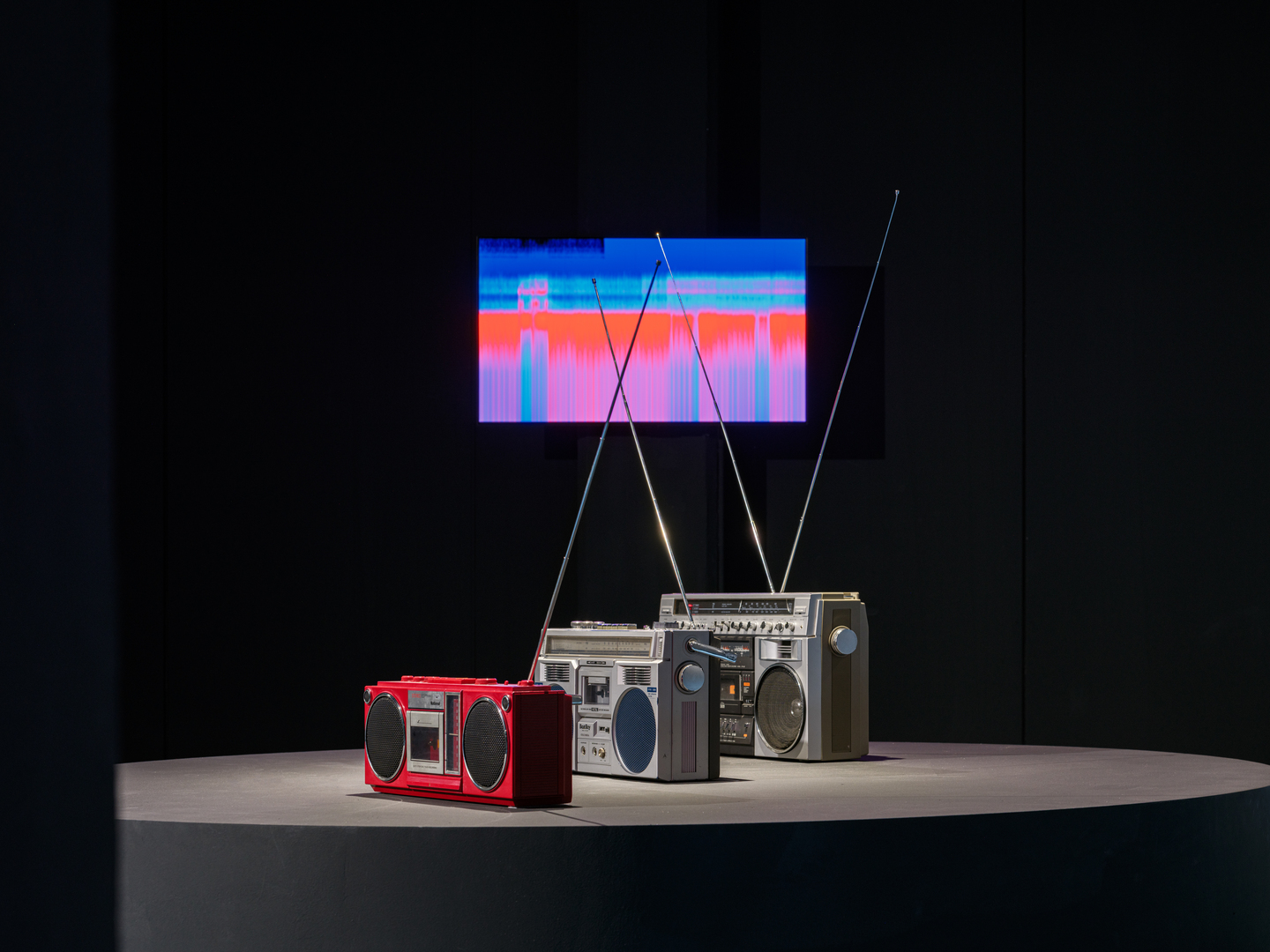
다니엘 무지추크는 폴란드 우치에 있는 슈투키 박물관의 디렉터이다. 기획한 주요 전시로 《Sounding the Body Electric: Experiments in Art and Music in Eastern Europe 1957–1984》(데이비드 크롤리 공동 기획), 《Notes from the Underground: Art and Alternative Music in Eastern Europe 1968-1994》(데이비드 크롤리 공동 기획), 《The Museum of Rhythm》(나타샤 진발라 공동 기획), 《Through The Soundproof Curtain: The Polish Radio Experimental Studio》(미하우 멘디크 공동 기획), 《Work, work, work (work) 》(셀린 콘도겔리와 웬델리엔 판 올덴보르흐 공동 기획) 등이 있다. 아그니에슈카 핀데라와 공동으로 제55회 베니스비엔날레 폴란드관을 기획한 바 있으며, 2025년 스펙터 프레스에서 출간될 다음 책을 준비 중이다.
한 가족이 차를 타고 가고 있다. 그들은 조용한 차 안에서 갑작스러운 변화를 함께 경험한다. 기절 직전의 상태까지 가 있었던 운전자는 이 변화로 인해 가까스로 다시 정신을 차린다. 큰 사고가 날 뻔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현상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모두가 무언가를 느꼈다.
작가 메레디스 영-사우어스는 그 차에 타고 있던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이 일을 ‘개개인의 공명’이 재구성되어 탑승자들이 무사할 수 있었던 은총이라 설명한다. 운전자가 의식을 놓아버리기 직전의 상태까지 가면서 ‘음’의 변화를 촉발했다. 음 하나에 미친 영향이 다른 음들의 평온한 조화를 깨트렸고, 모두에게 다가오는 위험에 관한 경고가 된 것이다.
영-사우어스는 이 경험이 자신을 깨달음으로 인도한 신비로운 천상의 존재인 ʻ멘토’가 전한 이론에 대한 확증이라고 받아들였다. 그녀는 멘토의 가르침을 책으로 펴냈고,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한 명상 테이프 시리즈를 제작했다.1 테이프에 수록된 일곱 편의 곡은 각각 신체의 다른 부분에 위치한 일곱 개의 차크라, 즉 영적 탐색, 직관, 소통, 사랑, 개인의 역량, 땅과의 연결, 그리고 정서적·성적 균형에 관한 것이었다. 일곱 차트라 모두 연속적 저음(아날로그 드론)으로 이루어진 3화음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 양식에 있어 미니멀리스트 전자 음악의 고전들과 많은 유사점을 보인다. 허나 각 곡에는 명확히 정해진 실용적 용도가 있다. 3화음의 다양한 조합은 특정 차크라를 활성화하고 영향을 주며, 청취자의 내적 음고(피치)를 조율함으로써 원하는 주파수로 공명하게 한다.
이는 모두 현실의 본질에 관한 아주 오래된 이론에 기반한다. 수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이자 음률 이론을 처음 창시한 피타고라스는 한 종교 종파의 정신적 지도자이기도 했다. 그 신도들은 ‘천체의 음악’에서 표현된 조화가 우주를 다스리는 원칙이라 믿었으며, 모든 면에서 이 근본적인 법칙을 따른다면 삶의 모든 국면이 아름답고 올바를 것이라 믿었다. 음악에서 조화로운 음정은 별자리를 이루는 별들 간의 관계를 본뜬 것인데, 신체와 영혼의 조율 또한 이를 따라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루돌프 슈타이너가 쓰길, “다른 모든 예술은 자연의 관념을 나타낸 것이지만, 음악은 자연의 의지를 표현한다. 음악은 세상의 심장부에 더 가까이 흐르고, 그 출렁이고 부풀어 오르는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2
영-사우어스가 전하는 일화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가 겪었던 현상 한 편에는 공간적인 차원이 있다. 다양한 음들의 조합(그리고 그들의 분열)은 주변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소리는 공간적 배열을 내포하는데, 이는 그 조화로운 구조 내에서 청자의 위치에 따라 구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소리는 공간을 벗어나 있어, 다양한 개개인의 음은 텔레파시를 통해 관계가 형성된다. 이 음들은 들리기보다는 ‘느껴지는’ 것이라 함이 옳고, 그 위치 또한 특정할 수 없다.
사운드 텔레파시라는 현상은 음악사의 흐름에서 예상치 못한 시점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잘 알려진 일화에 따르면—비록 출처는 불분명하지만—사운드 텔레파시는 안톤 베베른과 그가 작곡에 활용한 ‘펜사토’라는 표기법의 사용과 관련이 있다. 펜사토란, 연주자의 생각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을 만큼 조용한 음을 의미한다. 이 음은 귀로 들을 수 있는 파장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각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전달되는 정신적 진동으로 보는 게 옳을 것이다.
베베른은 피타고라스가 정립한 화성 체계에 반하는 십이음계법을 가장 설득력 있게 대변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피타고라스의 화성 체계가 음계의 모든 음에 동일한 중요성을 두었다면, 이 새로운 체계로 작업하는 작곡가들은 그에 걸맞은 전혀 다른 규칙을 만들었다. 베베른은 작곡에 있어서 수학적 논리에 기반한 매우 엄격한 구조를 바탕으로 작업했다. 그런 연유로 오늘날까지 그를 극단적 합리주의자로 여기는 시선들이 많지만, 사실 베베른은 에소테릭한 신지학에 뿌리를 둔 새로운 형태의 영성에 깊게 매료돼 있었다. 어머니의 죽음은 베베른의 작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베베른은 자신의 음악을 새로운 현실로 나아가기 위한 영적 발전의 도구로 여겼다. 1910년 쇤베르크에게 쓴 편지에서 그는 십이음계법과 음의 해방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 이야기의 끝에는 단 한 가지의 결론밖에 없을 것이다. 동물이나 다름없는 상태의 인간은 조금씩 성장을 거듭하며 이 땅에서 살 필요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리하여 인간, 그 육체적 존재는 또다시 사라진다.”3
베베른은 1932–1933년의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쇤베르크가] 만들어낸 화음에서는 조음과의 연결성이 더 이상 필요 없어졌고, 이는 바흐의 시대부터 현시점까지 음악적 사고의 기반을 이루었던 장조와 단조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했다. 쇤베르크는 이를 다음처럼 비유하여 표현한다. ‘마치 이중 젠더가 더 훌륭한 종으로 거듭나는 것처럼!’4
음악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이 있다. ‘더 우월한 종’의 ‘인간’을 지향한다는 뜻이 아니라, 인종, 종이나 성별 같은 속성을 완전히 초월하는 것이다. 루돌프 슈타이너는 음악을 자연과 가장 가까운 예술의 형태로서 주목하며 상반된 힘의 화해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험실이라 여겼고, 이를 통해 우주의 균형, 즉 천국과 지옥의 화합을 이룰 수 있다 믿었다. 따라서, 베베른은 화성 이론을 무너트리기보다는 오히려 그 초기 원칙으로 돌아가려 한 것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전통적인 화음 구성 방식이 신성한 천체들의 영원한 질서를 모델로 삼은 것처럼, 새로운 배열 방식을 정립한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여는 것과 같다.
베베른은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와 특히 오노레 드 발자크의 소설 『세라피타』 (1834)에서 접한 무성의 천사라는 존재에 깊이 빠져 있었다. 『세라피타』는 발자크가 에마누엘 스베덴보리로부터 영감을 받아 완성한 작품으로, 제목과 같은 이름을 지닌 주인공 세라피타와 사랑에 빠진 한 남성과 여인의 이야기를 다룬다. 완벽한 양성체인 세라피타는 남성에게는 여성으로, 여성에게는 남성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소설은 그들의 승천에 대한 환영으로 끝을 맺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어쩌면 베베른의 촘촘한 형식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될 몇 가지 음악적 은유가 등장한다.
각 세계에는 그 둘레의 모든 점들이 수렴되는 중심부가 있었다. 그 세계들 또한 그들이 이루고 있는 체계의 중심을 향해 움직이는 점들이었다. 각 체계의 중심은 불타오르고 꺼지지 않는 모든 존재의 원동력과 통하는 거대한 천상의 영역에 위치했다. 따라서 가장 거대한 세계부터 가장 작은 세계까지, 그리고 가장 작은 세계부터 그것을 구성하는 존재들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 모든 것은 개별적으로 존재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눌 수 없는 하나였다.5
발자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계들의 별자리는 각자 고유한 매개변수에 따라 작동하고, 베베른은 이 전략을 바탕으로 곡을 썼다. 그의 작품들은 천상의 법칙으로 새로운 세계를 빚어내는 정교하게 구성된 메커니즘이다. 그 간결하고 압축된 성질은 시간성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반복해서 청취해야만 그 복잡한 구조를 이해할 수 있기에 녹음의 시대에 안성맞춤이다. 따라서 그 경험은 시간 속에서 펼쳐지기는 하나 명확하게 선형적이거나 서사적이지 않다. 한 편의 음악으로서 베베른의 작품들은 시간 속에서 경험되지만, 그 본질은 비시간적이라는 점에서 움직이는 조각품과 비교될 수 있다. 피에트 몬드리안의 영적 여정과 마찬가지로, 베베른은 비이성과 이성의 융합을 목표로 나아갔다.
일부 음악학자들에게는, 영-사우어스의 작업을 베베른의 것과 견주는 것조차 신성모독으로 느껴질 것이다. 베베른의 작업은 하이 모더니즘의 가장 위대한 성과라 평가받는 음렬주의 전통의 초석을 세운 데에 반해, 영-사우어스의 작업은 우연히 천상계를 가로지르다 고작 드론 음악의 들판을 침범해 버린 뉴에이지 여행자와도 같으니까. 엄청나게 복잡한 베베른과 단순한 구조가 특징인 영-사우어스의 작품은 그 형태와 지위에 있어서 서로 완전히 상충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놀랄 만큼 일치한다.
그 목표란, 영원한 음의 별자리와의 조율이며, 역사적 시간의 풍경으로부터의 해방이다. 공간적 비유는 여기서 또 한 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프랑크푸르트 학파 철학자 귄터 안더스가 제시한 청취 이론에 의하면, 음악의 본질적 특징은 바로 공간성이다. 청취자는 세상이 아니라 음악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학적 탐구 방식을 따라, 그는 이 같은 존재 양식을 일련의 특징 목록으로 다루었다.
[음악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벗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어딘가에 존재한다. 그런 공백 속에서도 우리는 시간이라는 매개 속에 남게 된다. 다른 현실을 마주하면서, 청취자의 (개인적, 역사적) 삶은 상상의 영역이 되어버리며, 또한 음악 속에 존재하는 상황들 사이의 간격 정도에 지나지 않게 된다. 청취자 개인은 더 이상 스스로가 아니다. 완전히 변신한다. 다시 자신으로 돌아가야 한다.6
의식과 공명의 연결성은 자연스럽게 뉴에이지 영성주의와 고전주의 음악의 전통을 이은 한 작곡가로 우리를 이끌게 된다. 폴린 올리베로스의 ‘딥 리스닝[깊이 듣기]’은 청각적 환경에 집중하는 의식적 몰입 행위를 통해 가장 깊은 공명에 도달하고자 하는 노력에 관한 것이다. 올리베로스는 언제나 자신의 능동적 청취 방식과 명상 사이의 차이점을 강조했지만, 대안적 영적 전통은 그녀의 작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올리베로스의 연습곡과 텍스트 악보는 여러 연주자들을 위해 쓰였는데, 이는 다양한 상호주관적 형태를 유도하며, 그중 다수의 작품은 텔레파시라든가 관습적인 의미에서 ‘들리지’ 않는 소리를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 〈천사와 악마〉(1980)라는 작품은 이러한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천사는 이 명상 행위의 수호신 무리를 상징한다.
악마는 창조적 천재성을 지닌 개별 영혼들을 나타낸다.
천사들이 내는 안정되고 일정한 숨결 길이의 음색은, 다른 천사들의 안정되고 일정한 숨결 길이의 음색과 최대한 완벽하게 어우러진다.
악마들은 각자 영혼으로부터 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내면에 귀를 기울인다.
내면에서 먼저 들린 소리라면 표현되어도 좋다.
이 명상이 진행되는 동안 천사는 악마가, 악마는 천사가 될 수 있다.
영혼들이 움직일 때까지 몇 분간 그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7
악마 역할을 맡은 연주자들이 각자의 내적 공명에 주의를 기울일 동안 천사들은 공유 공간을 만든다. 각자 원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기에, 이렇게 만들어진 곡은 유동적이며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사회적 구조를 무대에 올린다. 한순간 내적 영혼의 표현을 통해 충만해진 삶은 이내 다른 ‘천재들’이 각자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의 창조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악마는 내면의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상력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그런 다음엔 거기서 표현을 끌어내야 한다. 그러나 그 메시지를 전달받으려면 당신의 상상력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천사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집중하며 바깥세상과 가능한 한 완벽한 화합을 이루는 데 주목한다. 다만,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가늠하는 과정에서 그 메시지는 변화할 수도 있다.8
올리베로스는 이 작품이 조율 명상 연습곡을 창작하던 중,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개개인의 요구로 인해 계속 방해를 받아 실패하고 나서 쓰게 된 것이라 고백했다. 〈천사와 악마〉는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면서도 모두를 조화로 이끌 수 있는 길을 제안한다. 올리베로스는 악마의 까다로운 표현 방식을 따르는 데 지친 참여자들이 결국은 모두 천사가 되는 것을 목격했다.
시간 속 신체를 나타내는 두 가지 방식—즉흥연주와 자기표현—은 그저 악마들이 천사들과 합류하여 영적으로 완벽한 비역사적 영역을 창조하는 것이 자신들의 운명임을 깨닫도록 하고자 도입된다. 올리베로스와 베베른 두 사람 모두 천사에 관심을 가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발자크의 소설명과 동명의 주인공처럼, 천사들은 무성의 존재로서 이분법적 대립을 초월한다.
발터 벤야민이 남긴 유명한 말 중에는 “사물에 있어 관념이란 별들에 있어 별자리와도 같은 것이다”9라는 문장이 있는데, 베베른의 초소형 세계들과 올리베로스의 광활한 청각적 공간 사이에도 유사한 관계성이 성립될 수 있다.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올리베로스의 관점에서 한 사람에게 딥 리스닝의 경험을 열어주는 것은 바로—종종 텍사스나 뉴멕시코의 황량한 자연 경관에 몰입하면 촉진되는—연민이다. 뉴멕시코에 거주하는 시인 메이메이 베르센부르거 또한 『별에 관한 논고』 (2020)라는 놀라운 작업에서 비슷한 주장을 한 바 있다. 공명으로 구조화된 우주에서 그녀는 별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빛과 음파를 연결하여, 우주가 전하는 메시지에 조율된 삶의 형태를 긍정하게 된다. “내 세포 속으로 침투하는 음들이 느낌으로 변형되면, 두 세상이 하나로 인식된다. 나는 나의 생각, 시각, 감정을 돌려보내고, 우리는 함께 내 안에 잠든 지식을 깨워 새로운 진동을 형성한다.”10
이 예시에서 ‘조율(튜닝)’은 음들이 매개되고 조정될 수 있는 새로운 청각적 공간을 창조한다. 올리베로스처럼 베르센부르거 역시 천사적 힘이 매개하는 공동의 청각적 세계를 건설한다. 이 별자리들은—베베른의 완벽하게 자기 완비된 구조와 같은—사물이 아니라, 공명음들이 만드는 역동적인 구성과 다름없다.
-
Meredith L. Young-Sowers, Agartha: Journey to the Stars (Stillpoint Pub, 1984). ↩
-
Rudolf Steiner, “Music, the Astral World and Devachan,” in Music, Mysticism and Magic: A Sourcebook ed. Joscelyn Goodwin (Arcana, 1986), 254. ↩
-
Quoted in Julie Pedneault-Deslauriers, “Webern’s Angels: Rilkean Intransitivity and Transcendence in Two Lieder, Op. 8,” Journal of Musicology 32, no. 1 (Winter 2015). ↩
-
같은 책 ↩
-
Quoted and translated in Veit Erlmann, Reason and Resonance: A History of Modern Aurality (Zone Books, 2010), 325–26. ↩
-
Pauline Oliveros, “Deep Listening Pieces,” available link. ↩
-
Pauline Oliveros, interview by Tina Pearson, “Angels and Demons,” Musicworks, no. 31 (Spring 1985): 5 ↩
-
Walter Benjamin, The Origin of German Tragic Drama, trans. John Osborne (Verso, 1999), 34. [이 책의 국역본으로는 다음이 있다. 발터 벤야민, 『독일 비애극의 원천 』, 최성만, 김유동 옮김 (한길사, 2009)] ↩
-
Mei-mei Berssenbrugge, “Singing,” in A Treatise on Stars (New Directions, 2020), 81. ↩
본 저작물은 2025년 10월 발간 예정인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강령: 영혼의 기술』 (서울: 서울시립미술관, 미디어버스, 2025)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본 저작물은 저자의 동의 하에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웹사이트와 e-flux 저널에 선공개됩니다. 글의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자와 서울시립미술관, 미디어버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025 필자, 저작권자, 서울시립미술관, 미디어버스